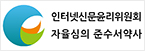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1차 '모수개혁' 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당장 2026년 1월 시행을 앞둔 이 개혁은 '첫걸음'이라는 평가와 '미흡한 봉합'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1차 개혁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연금개혁의 '2차전'이 이미 막을 올렸다. 1차 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공감대 아래 뒤늦게 가동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한 것이다.
그리고 이 2차전의 한복판에 '1천700조 원' 규모의 '미적립부채'(Unfunded Liabilities)라는 개념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14일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두고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한쪽에서는 "미래세대에 떠넘길 빚 폭탄"이라며 당장 이 규모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국제적으로도 잘 쓰지 않는 개념"이라며 "국민에게 불필요한 공포감을 조장한다"고 맞섰다.
미적립부채란 쉽게 말해 앞으로 국민연금이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총연금액(연금 약속)에서 현재까지 쌓인 적립금과 앞으로 들어올 보험료 수입을 뺀 차액이다.
당장 갚아야 할 빚(Debt)은 아니지만,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잠재적 부채'(Liability)로 해석될 수 있다.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계산해 발표하지는 않지만, 2021년 국민연금연구원이 70년 기준으로 이 규모를 1천735조 원, 150년 기준 3천453조 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미적립부채 공개를 주장하는 측은 "1차 모수개혁은 불충분하며,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2차 구조개혁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1천700조 원대 '숨겨진 빚'의 실체를 국민에게 솔직히 공개해야만 수급 연령 상향이나 기금 운용 개편 등 더 근본적인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들은 "미국 사회보장제도(OASDI) 역시 2025년 6월 보고서에서 향후 75년간 '재정 적자' 규모를 명시하고 2033년 기금 고갈을 경고하며 매년 개혁을 촉구한다"며 재정 현실 직시를 요구하고 있다.
반대편의 목소리도 날카롭다. 이들은 미적립부채라는 개념 자체가 국민연금의 '사회적 약속'(Social Contract)이라는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정부(기획재정부) 역시 "공무원연금 등과 달리 국민연금은 확정 부채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은 1차 모수개혁에서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을 일부 절충했는데, 이제 와서 1천700조 원이라는 충격적인 숫자를 끄집어내는 것은 2차 구조개혁 논의를 '혜택 축소' 일변도로 몰아가려는 의도라고 의심한다.
1천700조 원이라는 숫자가 '70년 뒤 물가까지 반영한 돈을 지금 당장 갚아야 할 빚'처럼 보이게 만드는 '착시 효과'가 있으며 "존재하지 않는 빚으로 국민적 공포만 조장한다"고 우려한다.
이 논쟁은 단순한 회계 기준 싸움이 아니다. '미적립부채'를 2차 구조개혁의 기준으로 삼느냐, 아니면 '가상의 숫자'로 보느냐에 따라 연금개혁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잠재적 빚'으로 본다면 재정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이나 혜택 축소 논의가 불가피하다.
반면 '가짜 공포'로 본다면 1차 개혁의 기조를 이어받아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의 구조개혁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1차 개혁의 성과 위에서 시작된 이 '1천700조 원 논쟁'이 우리의 노후가 걸린 2차 연금개혁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연합뉴스)